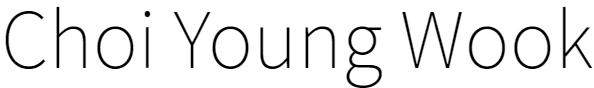뒤로가기
Jin Sup Yoon (Art Critic)
현재 위치
윤진섭 Yoon, Jin Sup
The Image of the Moon-Jar as the Epitome of Life
Jin Sup Yoon (Art Critic)
1.
The moon-jar (spelt as dalhangari in Korean), roundish and bulging in the middle, was named after its resemblance to the shape of the moon. It reminds you of the image of a full moon up afloat in the dark night sky on the first full moon day of the lunar calendar. The circular disk, as time goes by, is fated to be asymmetrical with one corner of it receding and tapering dint by dint. There could have been, I presume, a remote association between the unbalanced and plump form of the moon and the shape of a pot; the naming came from a sort of emotional response. The moon-jar, having been descended from the Chosun Dynasty does not have a perfectly circular appearance, which is rather different from its Chinese or Japanese counterpart. The Chinese or Japanese porcelains have different colours, whereas most of Chosun’s pots are white in colour. They have a mien similar to Chosun’s women dressed in their white garments; naïve and virtuous.
Choi Young Wook has been painting the Chosun’s moon-jar for quite a number of years. The image of the moon-jar almost fills up the whole canvas, which at a glance, looks as if the painter executed it using a hyperrealistic technique. This is why some viewers or critics are quick to categorize his work as a hyperrealism, but this interpretation is wrong. His work is not an objective representation of the image in a hyperrealistic style, but is rather, inclined to be subjective. The depiction of the image of the moon-jar is merely dressed in the style of figurative description. The only critical criterion that is summoned to interpreting his work as hyperrealistic is the reference to the description of the surface cracks on the pot, and this stems from the misunderstanding that the image of hairline cracks on the glazed porcelain surface represents the real fissure on the surface.
2. If so, what are the artist’s surface cracks referring to? What kind of thought did he have in mind while he meticulously drew the fine cracks of the jar surface? In order to answer these queries,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and go back to his earlier works. I was fortunate enough to be asked to write a catalogue essay for his second solo exhibition in 1996 and I feel obliged to briefly mention this issue centring on this critical misconception. For the show in 1996, he exhibited works that were mainly coloured in white and hues of grey. There were faint images of ordinary subjects such as birds, chairs, people, wild flowers, a piano, or grapes drawn against the backdrop. As a whole, the pictorial ambience felt as if the artist himself was having a conversation with the depicted subjects. It intoned his sensibility in a subdued voice. I was compelled to write as follows: “The encountering of Choi Young Wook’s works eventually means to submerge – to sink through and into his inner self. In other words, it is to apprehend the inside of an individual, a concrete form with mass and volume, through the delivering of an unfamiliar object. At this point, a piece of completed painting becomes a conduit to understanding and a clue to accessing the individual object. The figures, signs and symbols described on the canvas are the indispensible resources for comprehending the inner soul.” As written in this preface of mine, Choi Young Wook is a type of artist who talks to himself – it is perhaps constitutional. From the early years until recent times, he has been constantly engaged with his work based on this artistic constitution. To him, drawing the images of subjects on a whitish or greyish base signifies a symbolization of experiences in a condensed manner. For what does the artist do such codification, and what kind of meaning does it convey to the artist himself or to the society?
3. Prior to the issue in question, one needs to pay attention to the title of his work: Karma. The word, translated to yeon (緣, bond) in Korean, or up (業, action or deeds to bring good or bad results) in Buddhist connotations, is a metaphorical take of the human life. The relations and bonds entangled like a skein of threads among human beings deliver karma, and karma endlessly circulates – this is the kernel of the ‘yeonki (緣起) theory’ (the principle regarding the creation and extinction of all things in the universe) of Buddhism. This notion of ‘yeonki theory’ is employed behind Choi Young Wook’s action to draw the fine cracked lines that form a connected network. To quote his own words: “I drew every single line of the moon-jar, and it is not merely an expression of surface cracks of the porcelain. In life, we meet and separate, and meet again somewhere else: I wanted to express such journey of life. This is why I titled it ‘Karma’. Our life is never lived as it was intended to. I sometimes think that there is a presence of destiny. The lines are the expression of destiny, yeon (緣), or karma. All those long and tedious hours I spent on drawing lines were when I thought of my own yeon, karma.” Choi Young Wook’s behaviour in painting is synonymous to the concept of cultivating or disciplining – something that is seen in many of Korean Monochrome Painting (Dansaekhwa) artists. If it is not so, there is no other possible way to explain his undergoing of such a strenuous task as his artistic labour: he applies layers of various nuances of white onto the canvas and makes up the shape of the moon-jar as if the form seems to be slightly emerging from the background, then finally draws a multitude of fine lines. His painting action is a gesture for seeking the truth, and ultimately, a struggle for self-liberation. It is a gesture trying to move towards zenith, similar to the state of nirvana. However, it is not a religious effort but rather an artistic ritual; it has a different dimension and it is more humane. He spends a remarkable amount of time on painting, and faces an avalanche of distracting thoughts, which indicates that his action is only something very human and not of religious or spiritual origin – he is only an artist. Thus, his purely artistic deed is miles away from undergoing spiritual training. The creating of countless fissure lines on the neatly prepared field of white glaze is a metaphor of life, and at the same time a kind of sign. It is akin to an abridged secret code. On the part of the viewers, it takes imagination to decrypt it, let alone to have the empathy to be able to susceptibly identify it with the viewers’ own life. It has a rhizomatous structure stretching out into all directions, proliferating rigorously.
4. It is none other than a paradox that this rhizomatous feature of Choi Young Wook’s works, thoroughly grounded on the mode of an analogue display, is comparable to the mode of existence in the era of a digitalized civilization. Just like Jake’s remark from the film ‘Avatar’, “A billion trees belong to one giant tree”, the immeasurable thin lines in Choi Young Wook’s works visualize the unseen lines of connection in the domain of the social network Facebook. The invisible network of individual profiles amounting to nearly 900,000,000 reminds you of Choi Young Wook’s cracks; it is virtual yet real. Any meeting on Facebook can be made into a reality. Your action to press the button ‘like’ in regards to any statement or opinion that appears in cyberspace, is definitely a real action. There are also various kinds of emotion involved in cyber-actions, such as pleasure, cheering, love, rage, jealousy and hatred. Accompanied by such varying realistic emotions, friends of Facebook attempt to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in the borderless cyberspace. There, the difference of skin colour, religion, or ethnicity does not exist. Once they mutually agree to be friends, the communication starts right away even if there is a certain language barrier between them. It is similar to the flowing river: all kinds of different information loaded on Facebook flows and runs like water in real-time. It is an excellent image of life in the figurative sense.
5. Choi Young Wook emphatically said that his paintings were a medium for communication. A form of art involves someone who has created it and someone who will appreciate it, and the potential of an interactive communication is built in it. The interaction between an artwork and a viewer is not a patent on the media art relying on a directly responsive method. The interactive experience is possible even in the genre of paintings made by even the analogue method in Choi Young Wook’s work. For instance, when he looks back upon his own life, connecting the lines of the entire web, those who have the ability to grasp the grammar of the artwork will similarly project their own life onto his painting. The artist says: “What I hope is that those looking at my painting will think of their own stories and will be able to understand and communicate with people who are entangled in their own life.” “It is the path of our life. [I am not intending to] represent the realistic image of cracks on the porcelain surface. Those lines that I depict split, converge, cut off and meet again at some point. Likewise, in our life, we meet, leave each other, and we are alike yet arguably different, and we can be unified into one, even if we are somewhat different.” The cracks of the moon-jar is just as much of a symbol for the epitome of life, as a mere aesthetic object to be appreciated. Here is where the charm and ambiguousness of his moon-jar paintings pulsates. The image of the moon-jar at once not only emanates a traditional sense of beauty but a modern one as well. This inclusive aura comes from the colour, subject matter and form. The spectrum of elegant colours ranging from milky white to subtle white, variable grey and black, embodied on the traditional moon-jar, is the crystallization of the perseverance of Chosun potters. Whilst Choi Young Wook puts one foot into tradition, he is also committed to unravel the traditional beauty as something contemporary through the medium of painting. Upon observing his paintings from the technical aspect, there is a kind of optical trick hidden in his work. On the protruding part of the jar either includes a dab of shadow or an image of a traditional landscape, only to make it look genuinely real. Due to this element, the surface cracks provoke the viewers to have illusory feelings of believing them to be real, another reason why his works often come under the rubric of hyperrealism.
6. The image of the moon-jar has recently become more flat and minimal. The moon-jar has been losing its plump and bulging attributes and the changed features accentuates the flatness even more. At the same time, the hairline cracks spread all over the surface of the jar, and in proportion with the expansion of fine lines, the distinctiveness of the shape of the jar is lessened. Although taking such course may be seen as a minute change, he seems to be advancing towards a certain climax. He will eventually reach ground zero, except I cannot guess when it will be. However, it appears obvious that there is an analogy of life in his work, and he is gradually making the thin mesh of fissures bigger in the similar way as his own life is proceeding: it is a piecemeal procedure in which the facets of one’s life, central or minor, are entwined with those of others, weaving a skein of bond and connection – an endless journey towards ground zero.
윤진섭(미술평론가)
2. If so, what are the artist’s surface cracks referring to? What kind of thought did he have in mind while he meticulously drew the fine cracks of the jar surface? In order to answer these queries,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and go back to his earlier works. I was fortunate enough to be asked to write a catalogue essay for his second solo exhibition in 1996 and I feel obliged to briefly mention this issue centring on this critical misconception. For the show in 1996, he exhibited works that were mainly coloured in white and hues of grey. There were faint images of ordinary subjects such as birds, chairs, people, wild flowers, a piano, or grapes drawn against the backdrop. As a whole, the pictorial ambience felt as if the artist himself was having a conversation with the depicted subjects. It intoned his sensibility in a subdued voice. I was compelled to write as follows: “The encountering of Choi Young Wook’s works eventually means to submerge – to sink through and into his inner self. In other words, it is to apprehend the inside of an individual, a concrete form with mass and volume, through the delivering of an unfamiliar object. At this point, a piece of completed painting becomes a conduit to understanding and a clue to accessing the individual object. The figures, signs and symbols described on the canvas are the indispensible resources for comprehending the inner soul.” As written in this preface of mine, Choi Young Wook is a type of artist who talks to himself – it is perhaps constitutional. From the early years until recent times, he has been constantly engaged with his work based on this artistic constitution. To him, drawing the images of subjects on a whitish or greyish base signifies a symbolization of experiences in a condensed manner. For what does the artist do such codification, and what kind of meaning does it convey to the artist himself or to the society?
3. Prior to the issue in question, one needs to pay attention to the title of his work: Karma. The word, translated to yeon (緣, bond) in Korean, or up (業, action or deeds to bring good or bad results) in Buddhist connotations, is a metaphorical take of the human life. The relations and bonds entangled like a skein of threads among human beings deliver karma, and karma endlessly circulates – this is the kernel of the ‘yeonki (緣起) theory’ (the principle regarding the creation and extinction of all things in the universe) of Buddhism. This notion of ‘yeonki theory’ is employed behind Choi Young Wook’s action to draw the fine cracked lines that form a connected network. To quote his own words: “I drew every single line of the moon-jar, and it is not merely an expression of surface cracks of the porcelain. In life, we meet and separate, and meet again somewhere else: I wanted to express such journey of life. This is why I titled it ‘Karma’. Our life is never lived as it was intended to. I sometimes think that there is a presence of destiny. The lines are the expression of destiny, yeon (緣), or karma. All those long and tedious hours I spent on drawing lines were when I thought of my own yeon, karma.” Choi Young Wook’s behaviour in painting is synonymous to the concept of cultivating or disciplining – something that is seen in many of Korean Monochrome Painting (Dansaekhwa) artists. If it is not so, there is no other possible way to explain his undergoing of such a strenuous task as his artistic labour: he applies layers of various nuances of white onto the canvas and makes up the shape of the moon-jar as if the form seems to be slightly emerging from the background, then finally draws a multitude of fine lines. His painting action is a gesture for seeking the truth, and ultimately, a struggle for self-liberation. It is a gesture trying to move towards zenith, similar to the state of nirvana. However, it is not a religious effort but rather an artistic ritual; it has a different dimension and it is more humane. He spends a remarkable amount of time on painting, and faces an avalanche of distracting thoughts, which indicates that his action is only something very human and not of religious or spiritual origin – he is only an artist. Thus, his purely artistic deed is miles away from undergoing spiritual training. The creating of countless fissure lines on the neatly prepared field of white glaze is a metaphor of life, and at the same time a kind of sign. It is akin to an abridged secret code. On the part of the viewers, it takes imagination to decrypt it, let alone to have the empathy to be able to susceptibly identify it with the viewers’ own life. It has a rhizomatous structure stretching out into all directions, proliferating rigorously.
4. It is none other than a paradox that this rhizomatous feature of Choi Young Wook’s works, thoroughly grounded on the mode of an analogue display, is comparable to the mode of existence in the era of a digitalized civilization. Just like Jake’s remark from the film ‘Avatar’, “A billion trees belong to one giant tree”, the immeasurable thin lines in Choi Young Wook’s works visualize the unseen lines of connection in the domain of the social network Facebook. The invisible network of individual profiles amounting to nearly 900,000,000 reminds you of Choi Young Wook’s cracks; it is virtual yet real. Any meeting on Facebook can be made into a reality. Your action to press the button ‘like’ in regards to any statement or opinion that appears in cyberspace, is definitely a real action. There are also various kinds of emotion involved in cyber-actions, such as pleasure, cheering, love, rage, jealousy and hatred. Accompanied by such varying realistic emotions, friends of Facebook attempt to communicate with one another in the borderless cyberspace. There, the difference of skin colour, religion, or ethnicity does not exist. Once they mutually agree to be friends, the communication starts right away even if there is a certain language barrier between them. It is similar to the flowing river: all kinds of different information loaded on Facebook flows and runs like water in real-time. It is an excellent image of life in the figurative sense.
5. Choi Young Wook emphatically said that his paintings were a medium for communication. A form of art involves someone who has created it and someone who will appreciate it, and the potential of an interactive communication is built in it. The interaction between an artwork and a viewer is not a patent on the media art relying on a directly responsive method. The interactive experience is possible even in the genre of paintings made by even the analogue method in Choi Young Wook’s work. For instance, when he looks back upon his own life, connecting the lines of the entire web, those who have the ability to grasp the grammar of the artwork will similarly project their own life onto his painting. The artist says: “What I hope is that those looking at my painting will think of their own stories and will be able to understand and communicate with people who are entangled in their own life.” “It is the path of our life. [I am not intending to] represent the realistic image of cracks on the porcelain surface. Those lines that I depict split, converge, cut off and meet again at some point. Likewise, in our life, we meet, leave each other, and we are alike yet arguably different, and we can be unified into one, even if we are somewhat different.” The cracks of the moon-jar is just as much of a symbol for the epitome of life, as a mere aesthetic object to be appreciated. Here is where the charm and ambiguousness of his moon-jar paintings pulsates. The image of the moon-jar at once not only emanates a traditional sense of beauty but a modern one as well. This inclusive aura comes from the colour, subject matter and form. The spectrum of elegant colours ranging from milky white to subtle white, variable grey and black, embodied on the traditional moon-jar, is the crystallization of the perseverance of Chosun potters. Whilst Choi Young Wook puts one foot into tradition, he is also committed to unravel the traditional beauty as something contemporary through the medium of painting. Upon observing his paintings from the technical aspect, there is a kind of optical trick hidden in his work. On the protruding part of the jar either includes a dab of shadow or an image of a traditional landscape, only to make it look genuinely real. Due to this element, the surface cracks provoke the viewers to have illusory feelings of believing them to be real, another reason why his works often come under the rubric of hyperrealism.
6. The image of the moon-jar has recently become more flat and minimal. The moon-jar has been losing its plump and bulging attributes and the changed features accentuates the flatness even more. At the same time, the hairline cracks spread all over the surface of the jar, and in proportion with the expansion of fine lines, the distinctiveness of the shape of the jar is lessened. Although taking such course may be seen as a minute change, he seems to be advancing towards a certain climax. He will eventually reach ground zero, except I cannot guess when it will be. However, it appears obvious that there is an analogy of life in his work, and he is gradually making the thin mesh of fissures bigger in the similar way as his own life is proceeding: it is a piecemeal procedure in which the facets of one’s life, central or minor, are entwined with those of others, weaving a skein of bond and connection – an endless journey towards ground zero.
인생의 한 축도로서의 달항아리 그림
윤진섭(미술평론가)
1.
달항아리는 배가 불룩하니 둥근 모습이 꼭 달을 닮았다고 해서 붙은 이름이다. 마치 정월 대보름날 어두운 밤하늘에 둥두렷이 떠오른 보름달의 모습을 연상시킨다. 그 둥글던 보름달도 시간이 지나면 한 귀퉁이가 조금씩 이지러지면서 비대칭적인 형태를 띠게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좌우의 비례가 같지 않은 달의 통통한 몸에 대한 연상작용이 항아리에 유감(有感)돼 달항아리란 이름이 붙게 된 것이 아닐까 짐작해 본다. 한쪽이 약간 이지러진 조선 달항아리의 품새는 완벽하게 둥근 모양새인 일본이나 중국 도자기와는 사뭇 다른 형태미를 보여준다. 또한 중국이나 일본의 도자기가 채색 도자기인 반면, 조선의 도자기는 백자가 주류를 이룬다. 그 어수룩하면서도 후덕한 품이 꼭 흰옷 입은 조선의 여인네를 닮았다.
최영욱은 몇 년째 조선의 달항아리를 그리고 있다. 캔버스에 꽉 차게 그린 달항아리의 모습은 얼핏 보면 극사실 기법으로 재현해 놓은 것 같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의 작품을 극사실의 범주에 집어넣는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 해석한 것이다. 그의 작품은 객관적 묘사를 통한 극사실 계열이 아니라 오히려 주관적인 편에 속한다. 다만 형식만 구상적 양식을 빌리고 있을 뿐이다. 그의 작품을 극사실 회화의 범주에 편입시키는데 동원되는 유일한 ‘비평적 기준(critical criteria)’이 바로 빙열인데, 이는 도자기 표면에 자디잘게 갈라진 유약의 균열에 대한 묘사가 마치 실제의 빙열을 묘사한 것으로 오해한 데서 오는 비평적 오류인 것이다.
2. 그렇다면 최영욱의 작품에 등장하는 빙열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그는 과연 무슨 생각에서 그처럼 치밀한 균열을 달항아리의 표면에 그리고 있는 것일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의 초기작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다행히도 나는 1996년, 그의 두 번째 개인전에 부쳐 서문을 쓴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잠시 언급할 필요를 느낀다. 1996년, 두 번째 개인전에 출품한 작품들 역시 주조는 흰색과 회색이었다. 흰색이나 회색의 바탕에 새, 의자, 사람, 나무, 풀꽃, 피아노, 포도 등등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사물들이 희미한 형태로 나타나 있었다. 그 그림들의 내용은 마치 작가가 사물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였다. 그만큼 감성적이었고 나직한 톤의 목소리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음과 같이 썼다.
“최영욱의 작품과 만나는 것은 결국 그의 내부로 잠행해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생소한 한 개체의 전언을 통해 구체적인 질량과 부피를 가진 한 인간의 내면을 이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작가가 완성한 한 벌의 그림은 한 개체에 대한 이해의 통로이자 접근의 단초이다. 거기에 그려진 형상과 기호, 상징들은 내면읽기에 꼭 필요한 독해의 자료들이다.”
이 인용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최영욱은 독백형의 작가이다. 그것은 그의 체질인 것 같다. 그의 이러한 체질에 기반을 둔 창작 태도는 초기작부터 근작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그런 그에게 있어서 흰색 또는 희색조의 바탕에 사물을 그려 넣는 일은 다시 말해 체험을 응축해 기호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그런 기호화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며, 그 자신 혹은 사회에 대해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 것일까?
3. 이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일단 우리는 최영욱의 작품 제목이란 사실을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말의 ‘연(緣)’, 혹은 불교식으로 말해 ‘업(業)’으로 번역되는 이 단어는 인간의 생에 대한 비유이다. 인간과 인간 간의 실타래처럼 얽인 인연이 업을 낳고 그 업이 끊임없이 순환한다는 것이 불교식 연기설의 골자이다. 최영욱이 달항아리의 표면에 숱한 균열을 가는 실선으로 연결시키는 행위의 이면에는 이러한 연기설이 자리 잡고 있다. 여기서 잠시 작가의 말을 들어보도록 하자.
“그 달항아리 안에 일일이 선을 그었는데 그건 도자기의 빙열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만났다 헤어지고 어딘가에서 다시 만나는 우리의 인생길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내 그림의 제목은 ‘Karma’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의도한 데로만 가지 않고 어떤 운명 같은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본다. 나는 그 운명, 업, 연(緣)을 선으로 표현했다. 그 선을 긋는 지루하고 긴 시간들이 나의 연을 생각하는 시간들이었다.”
최영욱이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대부분의 한국 단색화(Dansaekhwa) 작가들이 그런 것처럼 일종의 수행과도 같다. 그렇지 않고서는 캔버스에 유백색 혹은 다양한 뉘앙스의 흰색으로 여러 번에 걸쳐 바탕을 칠하고, 그렇게 조성된 바탕 위에 약간 도드라지게 달항아리의 형태를 만든 다음, 그 안에 무수한 실선을 그어 빙열을 표현하는 그 지난한 행위를 해명할 방법이 없다. 그의 작화 행위는 구도의 몸짓이면서 궁극적으로는 자기 해방의 몸부림이다. 그것은 어떤 극점을 향해 나아가는 해탈의 몸짓이다. 그러나 그것은 종교가 아니라 예술이라는 점에서 차원이 다르며 보다 인간적이다. 그가 그림에 투여하는 도저한 시간과 화면을 마주할 때 직면하는 갖가지 상념들은 그의 행위가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임을 말해 준다. 그는 단지 예술가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행위는 예술적 행위이며 도의 획득과는 거리가 멀다. 그가 유백색으로 말끔하게 조성된 달항아리의 표면에 무수한 실선으로 균열을 그리는 행위는 따라서 인생에 대한 은유이며 일종의 기호인 셈이다. 그것들은 축약된 암호와도 같다. 그렇기 때문에 관객의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해독하기 위해 상상력이 필요하며, 감정이입적으로 자기화할 것을 요구받는다. 그것은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리좀적(rhizomatic) 구조를 지닌다. 참으로 왕성한 번식력이 아닐 수 없다.
4. 철저히 아날로그 방식에 의존하는 최영욱의 그림이 디지털 문명의 존재방식인 리좀적 양상을 보여준다는 것은 하나의 역설이 아닐 수 없다. 영화 <아바타>의 주인공 제이크가 “거대한 나무 하나에 1조 그루의 나무가 속해 있다.”고 말한 것처럼, 최영욱의 그림 속에 그려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실선들의 증식은 페이스북(facebook)의 보이지 않는 선들의 연결을 연상시킨다. 사이버 상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9억 명에 달하는 프로파일의 연결망은 마치 최영욱의 균열을 연상시킨다. 그것은 가상이지만 현실이기도 하다. 페이스북에서의 만남은 현실화되기도 한다. 사이버 상에 올라온 어떤 의견에 대해 ‘좋아요(like)’를 누르는 행위는 분명 현실적인 행위이다. 거기에도 분명 다양한 감정이 수반된다. 즐거움, 환호, 사랑, 분노, 질투, 증오가 존재한다. 그렇게 수반된 다양한 감정들을 통해 페이스북의 친구들(friends)은 물리적 경계가 없는 사이버 세계에서 서로 소통을 시도한다. 거기에는 피부색, 종교, 인종적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다. 상호 합의하에 친구가 되면 비록 어느 정도 언어의 장벽은 있을지언정 소통이 시도되는 것이다. 그것은 흘러가는 강물과도 같다. 실제로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각종 정보는 실시간으로 물처럼 그렇게 흘러간다. 그것은 인생에 대한 탁월한 비유이다.
5. 최영욱은 자신의 그림이 소통의 매개체라고 힘주어 말한다. 그림을 그린 창작자와 이를 감상하는 감상자가 존재하는 예술의 형식은 그 자체 상호 소통(interactive communication)의 가능성을 내장한다. 상호작용은 직접적인 감응방식에 의한 미디어 아트의 전매특허가 아니다. 최영욱과 같은 철저한 아날로그 방식의 회화에서도 가능하다. 가령, 최영욱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가는 실선을 그어 서로 연결시킬 때, 그 문법을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관람자는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투사할 것이다. 그는 말한다.
“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내 그림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떠 올리고 그 자신 속에 얽혀있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를(소통) 나는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길이다. 도자기의 빙열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갈라지면서 이어지고, 끊겼다 어딘가에서 다시 만나는 선처럼 우리의 인생도 만났다 헤어지고 비슷한 듯 하며 다르고, 다른 듯 하면서도 하나로 아우러진다.”
인생의 한 축도로서의 달항아리의 빙열은 그러나 그 자체 미학적 완상의 대상이기도 하다. 여기에 최영욱의 달항아리 그림이 지닌 매력과 중의성이 있다. 그것은 한국의 전통적인 미감을 듬뿍 머금고 있는 동시에 현대적인 느낌을 준다. 그러한 느낌은 주로 색감이나 소재, 형태에서 온다. 한국의 전통 달항아리에 구현된 아취 있는 빛깔들의 다양한 스펙트럼-유백색에서부터 은은한 흰색 또는 다양한 회색이나 검정에 이르는-은 조선시대 도공들이 이루어낸 땀과 노력의 결정체이다. 최영욱은 한편으로는 그러한 전통에 한 발을 담그고 한 발로는 회화를 매개로 이를 현대적으로 풀어내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기법적인 면에서 볼 때 최영욱의 달항아리 그림에는 일종의 시각적 트릭이 숨겨있다. 도자기의 불룩한 배 부분에 음영을 집어넣거나 산수화를 삽입하여 실제의 달항아리처럼 보이게 그리는 기법이 그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그의 빙열을 실제의 도자기에 난 균열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요인이며, 나아가서는 그의 그림을 극사실주의에 편입시키는 오해를 낳고 있다.
6. 최근에 들어서 최영욱의 달항아리 그림은 보다 평면적이 되면서 ‘미니멀’해지고 있다. 불룩한 달항아리의 존재감이 밋밋해지면서 평평한 느낌이 가일층 강조되기에 이른다. 그와 동시에 균열을 암시하는 실선들이 달항아리의 전면에 번져나가면서 그와 비례해 달항아리의 형태감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그러한 도정은 매우 미세한 변화지만 어떤 극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하여 나중에는 필경 어떤 0도의 지점에 도달할 터인데 그 시기가 언제일런지 나로서는 짐작이 가지 않는다. 다만 이제까지 그의 인생이 그랬던 것처럼 아주 느리게, 그러나 크고 작은 삶의 단면들이 타인의 그것과 얽혀 인연의 실타래를 엮었듯이, 그의 그림 또한 그것의 한 유비(analogy)로서 균열의 망을 점진적으로 엷게 키워가고 있을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영도(零度)의 지점을 향한 끝없는 여행으로서 말이다.
2. 그렇다면 최영욱의 작품에 등장하는 빙열의 정체는 과연 무엇인가? 그는 과연 무슨 생각에서 그처럼 치밀한 균열을 달항아리의 표면에 그리고 있는 것일까?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그의 초기작으로 거슬러 올라갈 필요가 있다. 다행히도 나는 1996년, 그의 두 번째 개인전에 부쳐 서문을 쓴 적이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 잠시 언급할 필요를 느낀다. 1996년, 두 번째 개인전에 출품한 작품들 역시 주조는 흰색과 회색이었다. 흰색이나 회색의 바탕에 새, 의자, 사람, 나무, 풀꽃, 피아노, 포도 등등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사물들이 희미한 형태로 나타나 있었다. 그 그림들의 내용은 마치 작가가 사물과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였다. 그만큼 감성적이었고 나직한 톤의 목소리였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음과 같이 썼다.
“최영욱의 작품과 만나는 것은 결국 그의 내부로 잠행해 들어가는 것을 뜻한다. 생소한 한 개체의 전언을 통해 구체적인 질량과 부피를 가진 한 인간의 내면을 이해하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때, 작가가 완성한 한 벌의 그림은 한 개체에 대한 이해의 통로이자 접근의 단초이다. 거기에 그려진 형상과 기호, 상징들은 내면읽기에 꼭 필요한 독해의 자료들이다.”
이 인용문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최영욱은 독백형의 작가이다. 그것은 그의 체질인 것 같다. 그의 이러한 체질에 기반을 둔 창작 태도는 초기작부터 근작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다. 그런 그에게 있어서 흰색 또는 희색조의 바탕에 사물을 그려 넣는 일은 다시 말해 체험을 응축해 기호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그런 기호화란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이며, 그 자신 혹은 사회에 대해 어떤 의미를 띠고 있는 것일까?
3. 이 문제를 살펴보기 전에 일단 우리는 최영욱의 작품 제목이
“그 달항아리 안에 일일이 선을 그었는데 그건 도자기의 빙열을 표현한 것이 아니고 만났다 헤어지고 어딘가에서 다시 만나는 우리의 인생길을 표현한 것이다. 그래서 내 그림의 제목은 ‘Karma’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의도한 데로만 가지 않고 어떤 운명 같은 것이 있지 않나 생각해 본다. 나는 그 운명, 업, 연(緣)을 선으로 표현했다. 그 선을 긋는 지루하고 긴 시간들이 나의 연을 생각하는 시간들이었다.”
최영욱이 그림을 그리는 행위는 대부분의 한국 단색화(Dansaekhwa) 작가들이 그런 것처럼 일종의 수행과도 같다. 그렇지 않고서는 캔버스에 유백색 혹은 다양한 뉘앙스의 흰색으로 여러 번에 걸쳐 바탕을 칠하고, 그렇게 조성된 바탕 위에 약간 도드라지게 달항아리의 형태를 만든 다음, 그 안에 무수한 실선을 그어 빙열을 표현하는 그 지난한 행위를 해명할 방법이 없다. 그의 작화 행위는 구도의 몸짓이면서 궁극적으로는 자기 해방의 몸부림이다. 그것은 어떤 극점을 향해 나아가는 해탈의 몸짓이다. 그러나 그것은 종교가 아니라 예술이라는 점에서 차원이 다르며 보다 인간적이다. 그가 그림에 투여하는 도저한 시간과 화면을 마주할 때 직면하는 갖가지 상념들은 그의 행위가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것임을 말해 준다. 그는 단지 예술가일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행위는 예술적 행위이며 도의 획득과는 거리가 멀다. 그가 유백색으로 말끔하게 조성된 달항아리의 표면에 무수한 실선으로 균열을 그리는 행위는 따라서 인생에 대한 은유이며 일종의 기호인 셈이다. 그것들은 축약된 암호와도 같다. 그렇기 때문에 관객의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해독하기 위해 상상력이 필요하며, 감정이입적으로 자기화할 것을 요구받는다. 그것은 사방으로 뻗어나가는 리좀적(rhizomatic) 구조를 지닌다. 참으로 왕성한 번식력이 아닐 수 없다.
4. 철저히 아날로그 방식에 의존하는 최영욱의 그림이 디지털 문명의 존재방식인 리좀적 양상을 보여준다는 것은 하나의 역설이 아닐 수 없다. 영화 <아바타>의 주인공 제이크가 “거대한 나무 하나에 1조 그루의 나무가 속해 있다.”고 말한 것처럼, 최영욱의 그림 속에 그려진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실선들의 증식은 페이스북(facebook)의 보이지 않는 선들의 연결을 연상시킨다. 사이버 상에 존재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9억 명에 달하는 프로파일의 연결망은 마치 최영욱의 균열을 연상시킨다. 그것은 가상이지만 현실이기도 하다. 페이스북에서의 만남은 현실화되기도 한다. 사이버 상에 올라온 어떤 의견에 대해 ‘좋아요(like)’를 누르는 행위는 분명 현실적인 행위이다. 거기에도 분명 다양한 감정이 수반된다. 즐거움, 환호, 사랑, 분노, 질투, 증오가 존재한다. 그렇게 수반된 다양한 감정들을 통해 페이스북의 친구들(friends)은 물리적 경계가 없는 사이버 세계에서 서로 소통을 시도한다. 거기에는 피부색, 종교, 인종적 차이도 존재하지 않는다. 상호 합의하에 친구가 되면 비록 어느 정도 언어의 장벽은 있을지언정 소통이 시도되는 것이다. 그것은 흘러가는 강물과도 같다. 실제로 페이스북에 올라오는 각종 정보는 실시간으로 물처럼 그렇게 흘러간다. 그것은 인생에 대한 탁월한 비유이다.
5. 최영욱은 자신의 그림이 소통의 매개체라고 힘주어 말한다. 그림을 그린 창작자와 이를 감상하는 감상자가 존재하는 예술의 형식은 그 자체 상호 소통(interactive communication)의 가능성을 내장한다. 상호작용은 직접적인 감응방식에 의한 미디어 아트의 전매특허가 아니다. 최영욱과 같은 철저한 아날로그 방식의 회화에서도 가능하다. 가령, 최영욱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가는 실선을 그어 서로 연결시킬 때, 그 문법을 독해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관람자는 거기에 자신의 인생을 투사할 것이다. 그는 말한다.
“내 그림을 보는 사람들이 내 그림 속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떠 올리고 그 자신 속에 얽혀있는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기를(소통) 나는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인생길이다. 도자기의 빙열을 사실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갈라지면서 이어지고, 끊겼다 어딘가에서 다시 만나는 선처럼 우리의 인생도 만났다 헤어지고 비슷한 듯 하며 다르고, 다른 듯 하면서도 하나로 아우러진다.”
인생의 한 축도로서의 달항아리의 빙열은 그러나 그 자체 미학적 완상의 대상이기도 하다. 여기에 최영욱의 달항아리 그림이 지닌 매력과 중의성이 있다. 그것은 한국의 전통적인 미감을 듬뿍 머금고 있는 동시에 현대적인 느낌을 준다. 그러한 느낌은 주로 색감이나 소재, 형태에서 온다. 한국의 전통 달항아리에 구현된 아취 있는 빛깔들의 다양한 스펙트럼-유백색에서부터 은은한 흰색 또는 다양한 회색이나 검정에 이르는-은 조선시대 도공들이 이루어낸 땀과 노력의 결정체이다. 최영욱은 한편으로는 그러한 전통에 한 발을 담그고 한 발로는 회화를 매개로 이를 현대적으로 풀어내는 일에 매진하고 있다. 기법적인 면에서 볼 때 최영욱의 달항아리 그림에는 일종의 시각적 트릭이 숨겨있다. 도자기의 불룩한 배 부분에 음영을 집어넣거나 산수화를 삽입하여 실제의 달항아리처럼 보이게 그리는 기법이 그것이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그의 빙열을 실제의 도자기에 난 균열처럼 착각하게 만드는 요인이며, 나아가서는 그의 그림을 극사실주의에 편입시키는 오해를 낳고 있다.
6. 최근에 들어서 최영욱의 달항아리 그림은 보다 평면적이 되면서 ‘미니멀’해지고 있다. 불룩한 달항아리의 존재감이 밋밋해지면서 평평한 느낌이 가일층 강조되기에 이른다. 그와 동시에 균열을 암시하는 실선들이 달항아리의 전면에 번져나가면서 그와 비례해 달항아리의 형태감은 점차 약화되고 있다. 그러한 도정은 매우 미세한 변화지만 어떤 극점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리하여 나중에는 필경 어떤 0도의 지점에 도달할 터인데 그 시기가 언제일런지 나로서는 짐작이 가지 않는다. 다만 이제까지 그의 인생이 그랬던 것처럼 아주 느리게, 그러나 크고 작은 삶의 단면들이 타인의 그것과 얽혀 인연의 실타래를 엮었듯이, 그의 그림 또한 그것의 한 유비(analogy)로서 균열의 망을 점진적으로 엷게 키워가고 있을 것만은 분명해 보인다. 영도(零度)의 지점을 향한 끝없는 여행으로서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