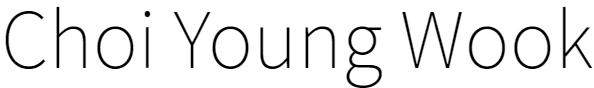뒤로가기
박영택(미술평론가, 경기대교수)
현재 위치
박영택 Park, Young Taek
최영욱 – 경계에서 사는 달 항아리
박영택(미술평론가, 경기대교수)
한 눈에 쉽게 걸려들지 않는 희박한 무채색 색채와 불분명한 윤곽선 속에서 다가오는 것은 이른바 익숙한 조선시대 백자 달 항아리의 기형이다. 마치 짙은 안개 속에서 모종의 물체가 떠오르듯, 혹은 캄캄한 기억의 지층 속에 깊숙이 잠겼던 흐릿한 이미지를 발굴해내듯이 그렇게 백자의 기형은 홀연히 출현한다. 따라서 이 달 항아리는 특정 대상의 재현이 아니라 보편적인 달 항아리에 대한 기호記號이자 보는 이들의 기억과 심상 속에 자리한 달 항아리를 건드려주는 매개로 작동한다. 특히 한국인이라면 저 달 항아리로 대변되는 이른바 한국적인 미감과 색채, 자연주의와 소박함 등의 여러 수사와 관념이 순식간에 떠오를 것이다. 특히나 달 항아리의 백색이 지는 의미망은 꽤나 무거운 편이다.
최순우는 조선 백자의 흰색이 검박함과 청렴함을 강조했던 조선 선비의 정신세계를 표상하는 차원에서 출현했고 그 색으로 대변되는 조선 선비의 중요한 덕목을 시각화, 물질화 할 필요성 때문에 백자의 백색이 등장하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는 비애의 미로서 백색을 규정한 야나기 무네요시의 논의를 넘어서고자 한 시도에 해당한다. 한편 순백자의 소색은 우리네 무명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는 것도 같다. 한국인의 전통적인 옷감인, 본래 소색의 무명천이 바로 백자의 색감이기도 하다. 무명은 질박하고 무기교하며 소백하고, 또 물레로 실을 자으므로 불규칙한 굵기로 인해 표면에 무수한 변화를 동반한다. 그것은 토기의 피부 질감이기도 하고 도자기의 색감과 물성을 그대로 연상시킨다. 혹자는 백자의 흰색은 불교에서 말하는 무의 성질로서의 백색, 공으로서의 색이라고도 말한다. 무색으로서의 흰색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분명하고 밝고 깨끗하며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서의 색으로 의미도 없고 집착도 없는 색이라는 것이다. 이는 원효(617~686)의 무애사상의 기초 위에서 수용된 선문화(불이不二의 사상)가 기저에 깔려있기에 가능하다는 시각이다. 그러니까 색의 유무를 따지지 않고 분별을 벗어나는 색이 바로 조선의 백자라는 얘기다.
최영욱의 그림은 보는 이들이 지닌 선험적으로 지닌 기억과 심상 이미지를 자극하기 위해서 이 소개자 요구되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는 그림의 방법론에서도 동일하게 연출된다. 달 항아리라는 특정 대상의 사실적인 재현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이미지와 기억을 길어 올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하는 조형적인 처리가 그것이다. 그래서 달 항아리는 아득하고 막막한 시간의 저편에서, 혹은 경계를 알 수 없는 무한한 잠재의식의 공간 어딘가에서 불현듯 출몰한다. 저 기형은 거의 정면에서 본 대상이자 약간 올려다 본 시점에서 포착된 형태다. 보는 이의 눈앞에 ‘스윽’ 밀고 들어와 버티고 서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구도다. 갑자기 내 의식에 떠오른 대상이자 망각의 흐름 속에서 순간 건져 올려낸 파리한 잔해와도 같다. 그것은 마치 실체가 없는 귀신과도 같은 존재다. 귀신은 살았다고, 죽었다고도 말하기 어려운 존재다. 바로 그 경계에서 사는 것이다. 이 달 항아리는 마치 나타나려는 것과 사라지려는 것 사이의 경계에 자리하고 있다. 단일한 색채로 말끔하게 도포된 배경과 그와 유사한 색채로 칠해진, 표면에서 약간 융기된 백자의 기형은 배경 속에 묻혀있으면서도 순간 후경을 밀고 나와 견고한 물성과 촉각적인 표면을 거느린 체 부풀어 올랐다가 차갑게 식은 물질로 고형화 되었다. 약간의 층을 이루면서 표면으로부터 솟은 달 항아리는 그림이면서 동시에 저부조의 물체성을 간직하면서 평면의 화면을 이탈하려 한다. 단색으로 유지된 항아리의 내부는 구연부와 굽 부분에만 동양화채색물감을 얹히고 명암을 주어 입체감을 느끼도록 배려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평면적인 느낌이 강하게 검출되면서도 이를 부분적으로 와해시키기도 한다. 지극히 사실적인 대상이면서도 매우 추상적이기도 하고 선명한 백자 항아리면서도 실체가 잘 잡히지 않는 형태이자 특정 색으로 명명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모든 언어와 문자를 자멸하게 만드는 기이한 색채로 잠겨있다. 그래서 보는 눈을 자꾸 헛디디게 한다. 눈目들이 길을 잃어 배회하는 사이에 그저 단독으로 설정된 달 항아리 하나가 화면을 가득 점유하면서 항아리의 표면으로 부단히 유혹한다.
달 항아리의 표면에는 무수한 빙열이 있다. 실제 백자의 표면에 빙열이 존재하지만 이 그림에서처럼 전면적으로 고르게 나 있지는 않다. 그러니 이 빙열은 작가에 의해 연출된 허구이자 상상의 선이다. 그런데 이 허구가 역설적으로 달 항아리의 맛을 더욱 그럴듯하게 고조시키는 한편 도편의 느낌 역시 더욱 실감나게 구현한다. 작가는 단색으로 마감된 정교한 기형 안에 숱한 균열을 연상시키는 선을 수성의 색연필로 그린다. 손의 흔적을 지워나간 체 배경과 기형을 단색으로 마감했다면 항아리 표면에 그려나간 선들은 작가의 손/노동에 전적으로 의지해 몸으로 밀고 나간 것이다. 가는 실선으로 연결되어 그물처럼 퍼져나가는 선은 백자 표면에 난 균열을 암시하는 선들이자 동시에 이른바 불교의 연기설, 모든 인연의 그물망을 암시한다고 한다. “만났다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우리의 인생길을 표현”(작가노트)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목이 <업 Karma>이다. 아마도 작가는 특정 달 항아리의 표면에 난 빙열을 흥미롭게 보고 이를 응용해 형상화하는 동시에 여기에 ‘업’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작가는 달 항아리 몸통 전체에 가늘고 균질하게 선들을 이어가면서 채운다. 그것은 마치 실제 항아리 표면에 자연스럽게 생겨난 빙열을 연상시키는 동시에 무한한 손의 놀림, 마음의 흐름이기도 하다. 갈래를 치는 온갖 상념을 짐짓 누르고 이른바 무념무상으로 이루어지는 반복이자 시간을 의도적으로 소모하는 선의 이어나감이고 그리기를 지속하는 알리바이로서의 궤적이다. 사실 그 선은 빙열의 효과를 보여주는 듯한 선이지만 실은 추상적인 선의 집적이자 대상과 목적을 망실한 그리기, 다만 그리기를 지연시키는 그리기라는 성격이 더욱 짙어 보인다. 그 선들은 직선과 약간씩 휘어진 선들이 교차하면서 하나의 선에서 또 다른 선이 우연적으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과정을 그저 순리대로 따르는 편이다. 하나의 선이 있어서 그 선을 매개로, 계기로 다른 선의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기에 이 선의 등장은 매우 우연에 의한 현상이다. 작가는 특정한 대상, 그러니까 달 항아리 형태를 인지시키는 도상(기호)을 화면 정중앙에 의도적으로, 당당히 배치한 후에는 이후 그 내부를 본인도 예측할 수 없는 순간의 경로에 내맡겨 다만 그 사건, 시간을 타고 흘러갈 뿐이다. 그것을 작가는 ‘업’이라고 부르고 있는지 모르겠다.
최영욱의 그림은 보는 이들이 지닌 선험적으로 지닌 기억과 심상 이미지를 자극하기 위해서 이 소개자 요구되었던 것 같다. 그리고 이는 그림의 방법론에서도 동일하게 연출된다. 달 항아리라는 특정 대상의 사실적인 재현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이미지와 기억을 길어 올리고 있다는 느낌이 들게 하는 조형적인 처리가 그것이다. 그래서 달 항아리는 아득하고 막막한 시간의 저편에서, 혹은 경계를 알 수 없는 무한한 잠재의식의 공간 어딘가에서 불현듯 출몰한다. 저 기형은 거의 정면에서 본 대상이자 약간 올려다 본 시점에서 포착된 형태다. 보는 이의 눈앞에 ‘스윽’ 밀고 들어와 버티고 서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구도다. 갑자기 내 의식에 떠오른 대상이자 망각의 흐름 속에서 순간 건져 올려낸 파리한 잔해와도 같다. 그것은 마치 실체가 없는 귀신과도 같은 존재다. 귀신은 살았다고, 죽었다고도 말하기 어려운 존재다. 바로 그 경계에서 사는 것이다. 이 달 항아리는 마치 나타나려는 것과 사라지려는 것 사이의 경계에 자리하고 있다. 단일한 색채로 말끔하게 도포된 배경과 그와 유사한 색채로 칠해진, 표면에서 약간 융기된 백자의 기형은 배경 속에 묻혀있으면서도 순간 후경을 밀고 나와 견고한 물성과 촉각적인 표면을 거느린 체 부풀어 올랐다가 차갑게 식은 물질로 고형화 되었다. 약간의 층을 이루면서 표면으로부터 솟은 달 항아리는 그림이면서 동시에 저부조의 물체성을 간직하면서 평면의 화면을 이탈하려 한다. 단색으로 유지된 항아리의 내부는 구연부와 굽 부분에만 동양화채색물감을 얹히고 명암을 주어 입체감을 느끼도록 배려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평면적인 느낌이 강하게 검출되면서도 이를 부분적으로 와해시키기도 한다. 지극히 사실적인 대상이면서도 매우 추상적이기도 하고 선명한 백자 항아리면서도 실체가 잘 잡히지 않는 형태이자 특정 색으로 명명할 수 있을 것 같으면서도 모든 언어와 문자를 자멸하게 만드는 기이한 색채로 잠겨있다. 그래서 보는 눈을 자꾸 헛디디게 한다. 눈目들이 길을 잃어 배회하는 사이에 그저 단독으로 설정된 달 항아리 하나가 화면을 가득 점유하면서 항아리의 표면으로 부단히 유혹한다.
달 항아리의 표면에는 무수한 빙열이 있다. 실제 백자의 표면에 빙열이 존재하지만 이 그림에서처럼 전면적으로 고르게 나 있지는 않다. 그러니 이 빙열은 작가에 의해 연출된 허구이자 상상의 선이다. 그런데 이 허구가 역설적으로 달 항아리의 맛을 더욱 그럴듯하게 고조시키는 한편 도편의 느낌 역시 더욱 실감나게 구현한다. 작가는 단색으로 마감된 정교한 기형 안에 숱한 균열을 연상시키는 선을 수성의 색연필로 그린다. 손의 흔적을 지워나간 체 배경과 기형을 단색으로 마감했다면 항아리 표면에 그려나간 선들은 작가의 손/노동에 전적으로 의지해 몸으로 밀고 나간 것이다. 가는 실선으로 연결되어 그물처럼 퍼져나가는 선은 백자 표면에 난 균열을 암시하는 선들이자 동시에 이른바 불교의 연기설, 모든 인연의 그물망을 암시한다고 한다. “만났다 헤어지고 다시 만나는 우리의 인생길을 표현”(작가노트)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제목이 <업 Karma>이다. 아마도 작가는 특정 달 항아리의 표면에 난 빙열을 흥미롭게 보고 이를 응용해 형상화하는 동시에 여기에 ‘업’이라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는 생각이다.
작가는 달 항아리 몸통 전체에 가늘고 균질하게 선들을 이어가면서 채운다. 그것은 마치 실제 항아리 표면에 자연스럽게 생겨난 빙열을 연상시키는 동시에 무한한 손의 놀림, 마음의 흐름이기도 하다. 갈래를 치는 온갖 상념을 짐짓 누르고 이른바 무념무상으로 이루어지는 반복이자 시간을 의도적으로 소모하는 선의 이어나감이고 그리기를 지속하는 알리바이로서의 궤적이다. 사실 그 선은 빙열의 효과를 보여주는 듯한 선이지만 실은 추상적인 선의 집적이자 대상과 목적을 망실한 그리기, 다만 그리기를 지연시키는 그리기라는 성격이 더욱 짙어 보인다. 그 선들은 직선과 약간씩 휘어진 선들이 교차하면서 하나의 선에서 또 다른 선이 우연적으로, 우발적으로 발생하는 과정을 그저 순리대로 따르는 편이다. 하나의 선이 있어서 그 선을 매개로, 계기로 다른 선의 사건이 발생하는 것이기에 이 선의 등장은 매우 우연에 의한 현상이다. 작가는 특정한 대상, 그러니까 달 항아리 형태를 인지시키는 도상(기호)을 화면 정중앙에 의도적으로, 당당히 배치한 후에는 이후 그 내부를 본인도 예측할 수 없는 순간의 경로에 내맡겨 다만 그 사건, 시간을 타고 흘러갈 뿐이다. 그것을 작가는 ‘업’이라고 부르고 있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