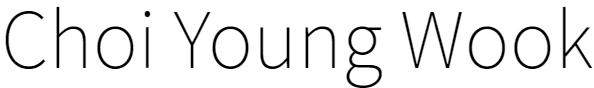뒤로가기
Yun Cheagab / Director HOW Art Museum
현재 위치
윤재갑 Yun, Chea Gab
Ode to Choi Young Wook’s Moon Jar
Yun Cheagab / Director HOW Art Museum
Once again, I wake up before dawn.
With birds chirping, I cannot resist waking up.
For a good while, I remain in bed listening.
I marvel at the clarity of the sounds.
I open the window and gaze at the pale moon against the crisp dawn sky.
The pure, innocent singing of the birds exudes such beautiful harmony in the moonlight.
The sun looks the same every day,
Yet the moon appears different each time, in terms of size, shape, and color.
The sun drives out all darkness,
Yet the moon reveals objects together with darkness.
Sunlight is so strong that one dare not look at it directly,
Yet the moonlight gently permeates everything.
Even my mother’s prayers before freshly drawn water,
At dawn on her wedding day,
Even my sister’s face that blossomed like a magnolia,
And even his jar, painted as if sculpted,
Is all filled with moonlight.
“Not all round shapes are the same.
They are all white in color. The tone of the white is yet different.
How could such a simple round form and a simple pure white tone
Radiate such a complex, subtle, wondrous beauty.”
Through these words of praise by Kim Whanki, the moon and jar become one.
Like a thousand moons shining on a thousand rivers
The jar becomes a thousand moons.
The jar of a potter is characterized by its function,
While the jar of an artist is linked to our aesthetics.
If the jar of a potter is the body, the jar of an artist should be the mind.
I hope our nature is like the moon jar,
Harboring generosity, kindness, and benevolence.
With such a mindset,
Choi paints moon jars as if shaping and firing them.
In the end, every human being must return to nature.
My body shall return to dust and be reborn into a jar.
Life and death are linked in this way,
And his jars embody the karma between humankind and nature.
Oh, now the moon is setting.
And once the moon sets, our busy lives will continue once again.
최영욱 선생의 달항아리에 부쳐
윤재갑(昊美術館 館長)
오늘도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지저귀는 새소리에 눈을 뜰 수밖에 없습니다.
누워서 한참을 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하도 청아해서 절로 감탄이 나옵니다.
창을 여니 서늘한 공기 사이로 새벽달이 보입니다.
티 없이 맑은 새소리와 달빛이 더없이 어우러집니다.
해는 매일 같은 모습이지만
달은 볼 때마다 크기나 모양, 빛깔이 다 다릅니다.
해는 모든 어둠을 물리치지만
달은 어둠과 사물을 함께 드러냅니다.
햇빛은 강렬해서 감히 마주 볼 수도 없지만
달빛은 모든 사물에 스며듭니다.
정화수에 담긴 어머니 기도에도
시집가던 날 새벽
목련처럼 하얗게 피어났던 누이의 얼굴에도
도자기를 빚듯 그린 그의 항아리 안에도
달빛이 가득 들어있습니다.
“둥글다 해서 다 같지가 않다.
모두가 흰 빛깔이다. 그 흰 빛깔이 모두가 다르다.
단순한 원형이, 단순한 순백이, 그렇게 복잡하고, 그렇게 미묘하고
그렇게 불가사의한 미를 발산할 수가 없다“
수화선생의 찬탄 속에 달과 항아리는 하나가 됩니다.
천 개의 강물위에 떠있는 천 개의 달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