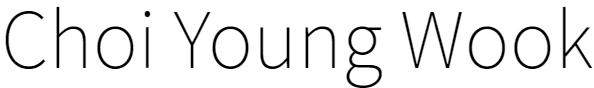뒤로가기
오광수ㅣ미술평론가, 뮤지엄 산 관장
현재 위치
오광수 Oh, Gwang Su
조형과 정서 - 최영욱의 달항아리에 대해
오광수ㅣ미술평론가, 뮤지엄 산 관장
Ⅰ.
달항아리는 17세기, 18세기부터 활발히 만들어지기 시작한 도자기로서 둥근 모양에 아무런 장식도 가해지지 않은 순백이 특징이다. 달을 연상해서 만든 것이라기보다 기능적인 측면에서 만들어졌지만, 그 둥근 모양이 보름달을 닮았다고 해서 달항아리로 명명되었을 것이다. 성형이나 이름이 다 같이 자연스럽다. 의도적이지도 기교적이지도 않은 심성의 결과로 자연스럽게 태어난 것이라 할 수 있다. 흰빛을 좋아하는 한국인들의 색채감각과 꾸미지 않는 소박한 마음씨가 어우러져 하나의 객체로서 존재감을 얻은 것이다. “우리네의 흰 의복과 백자 항아리의 흰색은 같은 마음씨에서 나온 것”(최순우)이라고 말해지듯 한국인의 정서와 조형의 일치임을 확인할 수 있다.
장식이 들어가 있지 않은 순백자(흰 빛깔이면서 뉘앙스가 풍부하다고 말해지기도 한다)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것이고 그것이 단순히 기능에 의해 만들어졌음에도 한국인의 마음을 이처럼 절묘하게 반영해주는 존재도 흔치 않다는 점에서 현대에 와서도 각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둥근 형태에서 오는 당당함과 표면의 때깔에서 오는 푸근함에 정서적 공감을 지닌 한국인은 물론이고 한국을 이해하려는 이국인들에게도 그 독특한 존재감이 주는 경이에 매료되고 있는 터이다. 일찍이 “백자에서 아직도 조형의 전위에 서 있다”고 갈파한 화가 김환기는 다음과 같은 백자의 예찬을 남긴 바 있다.
“진실로 소박하고 단순하고 건전하고 원만하고 우아하고 따뜻하고 동적인가 하면 정적이고 깊고 또한 어딘지 서러운 정이 도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아름다운 자기”
Ⅱ. 백자를 그림의 소재로 다룬 이는 도상봉과 김환기가 최초일 것이다. 도상봉이 꽃이 가득 담긴 둥근 백자 항아리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는가 하면 김환기는 50년대, 60년대를 통해 여인과 백자를 모티브로 한 작품과 백자들만으로 구성된 작품, 그리고는 백자가 자연스레 둥근 달로 전이되어 가는 작품을 남기고 있다. 이들 외에도 정물적 소재로 백자는 적지 않은 화가들의 화폭을 장식하였다. 근래에 들어오면서 몇몇 작가들에 의해 백자가 다루어지고 있음을 만나게 된다. 달항아리를 도자로서 직접 구워내는 경우가 있고 달항아리를 사진의 소재로서 다루는 경우가 있다. 백자를 회화로서 화면에 구현하는 경우도 있다. 달항아리를 직접 만들어내는 도자작업은 조선시대 달항아리를 전승한 것으로 항아리의 형태가 주는 독특한 면과 아울러 현대적 감각이 풍부한 조형의 재창조에 그 명분이 있다고 하겠다. 사진으로 구현하는 작업은 사진이란 매체가 지닌 심미적인 표현의 묘미를 보여주는데 특징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 화면에다 옮기는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페인팅에 의한 회화작업은 앞선 경우와는 또 다른 실존에 다가가는 긴장감이 있다. 세 경우가 구현에서나 내면에 있어 다른 점을 보이지만 달항아리라는 고유한 존재에 대한 보편적 정감의 접근이란 점에 일치되고 있다. 달이 중천에 하나밖에 없지만 지상에선 수많은 달이 묘출되듯이 말이다. 그처럼 최영욱이 그리는 달항아리도 보편 속의 특수성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Ⅲ. 왜 달항아리인가. 작가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그가 달항아리를 다루게 된 동기는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만난 백자와의 조우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마도 그가 흔히 볼 수 있는 인사동 골동가에서 만났다면 이런 감회는 없었을 것이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과거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한국관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특히 중국이나 일본관에 비해서는 말이다. 작가는 여기서 예기치 않은 달항아리와의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다. 거대한 미술 공간에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달항아리의 존재감에 감읍된 것이다. 아마도 이때의 심회는 강홍구의 다음 지적이 가장 잘 대변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최영욱의 달항아리는 일종의 오마쥬이다. 그의 오마쥬는 달항아리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달항아리에 내재하는 한국 특유의 심미성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작가는 이를 통해 단순히 달항아리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한국인의 미의식을 본 것이고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많은 것을 말하지 않지만 많은 것을 품고 있는, 지극히 단순해 보이지만 극도로 세련된 그 피조물을 먹먹히 보고 있노라면 달항아리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달항아리처럼 살고 싶은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작가의 독백은 결국 삶과 작업이 종내에는 하나를 지향하는 것이란 점을 은유적으로 표명한 것이 아닐까. 그가 항아리의 밑 부분에 가하는 일종의 섬세한 그려진 빙열에서도 어떤 다름을 추구하려는 은밀한 의도를 보이고 있다. “이 빙열은 작가에 의해 연출된 허구이자 상상의 선이다”고 박영택이 말하고 있듯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그저 있는 듯 없는 듯 나타나는 이 작은 선들의 구성 속에서도 그는 자기만의 어떤 서사를 심으려고 한다. 흔히 까르마라고도 하고 불교에서의 업이라고 하는 어떤 인연의 얽힘을 구현한 것이다.
Ⅳ. 그의 작품 앞에 서면 있는 듯 없는 듯한 예감에 넘치는 형태 속으로 빨려든다. 부분적으로 선명하게 떠오르다가 공간 속으로 끝없이 잠기는 차원은 확실히 몽환적이다. 그것은 마치 텅 빈 그릇이면서 동시에 꽉 찬 존재를 말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지만 어느덧 밀려와 가슴까지 차오른 밀물과도 같이. 단순한 생활의 기물로서 만들어졌던 존재가 또다른 존재로서 태어남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그가 그리는 백자는 도자기이자 동시에 도자기가 아닌 존재가 된다. 어쩌면 그것은 한 편의 시요 꿈결에서 만나는 해맑은 서사다. 아름다움의 실체이고 꿈의 현존이다. 존재하지 않으면서 존재하는 어떤 것이고 예감에 넘치는 실존의 자기 현현이다.
“진실로 소박하고 단순하고 건전하고 원만하고 우아하고 따뜻하고 동적인가 하면 정적이고 깊고 또한 어딘지 서러운 정이 도는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아름다운 자기”
Ⅱ. 백자를 그림의 소재로 다룬 이는 도상봉과 김환기가 최초일 것이다. 도상봉이 꽃이 가득 담긴 둥근 백자 항아리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는가 하면 김환기는 50년대, 60년대를 통해 여인과 백자를 모티브로 한 작품과 백자들만으로 구성된 작품, 그리고는 백자가 자연스레 둥근 달로 전이되어 가는 작품을 남기고 있다. 이들 외에도 정물적 소재로 백자는 적지 않은 화가들의 화폭을 장식하였다. 근래에 들어오면서 몇몇 작가들에 의해 백자가 다루어지고 있음을 만나게 된다. 달항아리를 도자로서 직접 구워내는 경우가 있고 달항아리를 사진의 소재로서 다루는 경우가 있다. 백자를 회화로서 화면에 구현하는 경우도 있다. 달항아리를 직접 만들어내는 도자작업은 조선시대 달항아리를 전승한 것으로 항아리의 형태가 주는 독특한 면과 아울러 현대적 감각이 풍부한 조형의 재창조에 그 명분이 있다고 하겠다. 사진으로 구현하는 작업은 사진이란 매체가 지닌 심미적인 표현의 묘미를 보여주는데 특징을 발견할 수 있을 것 같다. 화면에다 옮기는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페인팅에 의한 회화작업은 앞선 경우와는 또 다른 실존에 다가가는 긴장감이 있다. 세 경우가 구현에서나 내면에 있어 다른 점을 보이지만 달항아리라는 고유한 존재에 대한 보편적 정감의 접근이란 점에 일치되고 있다. 달이 중천에 하나밖에 없지만 지상에선 수많은 달이 묘출되듯이 말이다. 그처럼 최영욱이 그리는 달항아리도 보편 속의 특수성을 보인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Ⅲ. 왜 달항아리인가. 작가는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을 것이다. 그가 달항아리를 다루게 된 동기는 미국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만난 백자와의 조우로 거슬러 올라간다. 아마도 그가 흔히 볼 수 있는 인사동 골동가에서 만났다면 이런 감회는 없었을 것이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지만, 과거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의 한국관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다. 특히 중국이나 일본관에 비해서는 말이다. 작가는 여기서 예기치 않은 달항아리와의 극적인 만남이 이루어진 것이다. 거대한 미술 공간에 당당하게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달항아리의 존재감에 감읍된 것이다. 아마도 이때의 심회는 강홍구의 다음 지적이 가장 잘 대변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최영욱의 달항아리는 일종의 오마쥬이다. 그의 오마쥬는 달항아리에 대한 것이기도 하고 달항아리에 내재하는 한국 특유의 심미성에 대한 것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작가는 이를 통해 단순히 달항아리의 아름다움뿐 아니라 한국인의 미의식을 본 것이고 자신의 정체성을 자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는 이렇게 말한다. “많은 것을 말하지 않지만 많은 것을 품고 있는, 지극히 단순해 보이지만 극도로 세련된 그 피조물을 먹먹히 보고 있노라면 달항아리를 그리는 것이 아니라 달항아리처럼 살고 싶은 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작가의 독백은 결국 삶과 작업이 종내에는 하나를 지향하는 것이란 점을 은유적으로 표명한 것이 아닐까. 그가 항아리의 밑 부분에 가하는 일종의 섬세한 그려진 빙열에서도 어떤 다름을 추구하려는 은밀한 의도를 보이고 있다. “이 빙열은 작가에 의해 연출된 허구이자 상상의 선이다”고 박영택이 말하고 있듯 자세히 보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 그저 있는 듯 없는 듯 나타나는 이 작은 선들의 구성 속에서도 그는 자기만의 어떤 서사를 심으려고 한다. 흔히 까르마라고도 하고 불교에서의 업이라고 하는 어떤 인연의 얽힘을 구현한 것이다.
Ⅳ. 그의 작품 앞에 서면 있는 듯 없는 듯한 예감에 넘치는 형태 속으로 빨려든다. 부분적으로 선명하게 떠오르다가 공간 속으로 끝없이 잠기는 차원은 확실히 몽환적이다. 그것은 마치 텅 빈 그릇이면서 동시에 꽉 찬 존재를 말하는 것이다. 보이지 않지만 어느덧 밀려와 가슴까지 차오른 밀물과도 같이. 단순한 생활의 기물로서 만들어졌던 존재가 또다른 존재로서 태어남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그가 그리는 백자는 도자기이자 동시에 도자기가 아닌 존재가 된다. 어쩌면 그것은 한 편의 시요 꿈결에서 만나는 해맑은 서사다. 아름다움의 실체이고 꿈의 현존이다. 존재하지 않으면서 존재하는 어떤 것이고 예감에 넘치는 실존의 자기 현현이다.